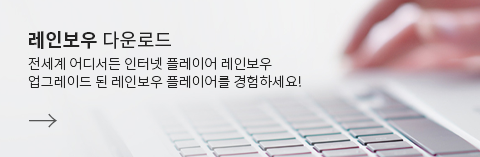- 유은영
- Jun 23, 2025
나는 요즘,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
이제 막 고2가 된 나는, 이른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른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작년부터 “새벽공기가 사람을 맑게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며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고, 나는 별 이유 없이 따라다니다가 어느새 아버지와 함께 걷는 시간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사실 처음엔 별생각이 없었다. 겨울방학에 할 것도 없고, 친구들도 다 학원에 가니 뒷산이라도 오르자 싶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산책 속에서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것을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산에 오를 때는 조금 다르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조용히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신다.
“내가 너만 할 땐, 새벽부터 신문 돌리고 학교 갔었어. 그때는 운동화 하나가 귀해서 바닥이 다 닳아도 꿰매서 신었지.”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다. 왠지 그 순간에 말을 덧붙이면 그 기억이 부서질 것 같아서다.
며칠 전, 아버지는 오래된 작은 수첩을 보여주셨다. 까맣게 바랜 표지에 군데군데 찢어진 종이.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글들이 있었다.
“이거, 내가 스무 살 무렵에 적던 일기장이야. 힘든 날마다 뭐라도 적어놓으려고 했거든.”
나는 조심스럽게 몇 장을 넘겼다. 거기엔 막노동을 하며 느낀 피로, 꿈을 좇다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처음 나를 품에 안았을 때의 떨림까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잠든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괜히 마음이 복잡해서. 늘 무심한 듯 말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누르고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예전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 근데 먹고 사는 게 먼저더라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아버지의 일기장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글이지만, 거기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진심이 있었다.
이제는 아침 산책길에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와 함께 아침밥을 지어먹는다. 전에는 그저 늦잠 자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소중하다.
아버지의 삶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속엔 울림이 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울림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아버지, 당신은 제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