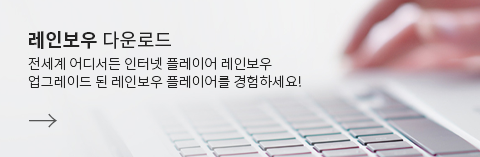23
2025.06
내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 박형준
- Jun 23, 2025
예약여부
즉시
내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여리고 작은 아픔 하나가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선뜻 끌어안을 수 없는
서럽고 여린 그 아픔이
오랜 망설임 끝에,
내 작은 그릇 안에 어설프게 몸을 누인 거라고 생각하면,
반가운 손님은 아니어도
기꺼이 손 내밀어 악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그릇처럼 명품도 아니고,
화사한 무늬도,
세련된 기품도 없는
그저 소박한 그릇이지만—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아픔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릇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픔이
내가 얼마나 여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려고
내 곁에 잠시 머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반기지 못했지만,
함께 있는 동안은 친구가 되어주고
떠나는 순간엔 웃으며 배웅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의 작고 보잘것없는 아픔을
조심스레 끌어안아봅니다.
아픔의 속살은,
참 여리고 따뜻합니다.